245 days to go
오늘의 책 : 디컨슈머, J.B.매커넌
- 저자
- J B 매키넌
- 출판
- 문학동네
- 출판일
- 2022.12.05
소설과 산문만 읽다가 오랜만에 사회과학 책을 읽으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 대해 깨우칠 수 있어 좋다. 별생각 없이 해왔던 나의 소비생활도 되돌아보게 되고, 이런 소비 활동들이 이 세계에, 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독서는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
환경파괴의 배후에는 무분별한 소비가 있었다.
재생 에너지 등 그 어떤 기술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소비욕구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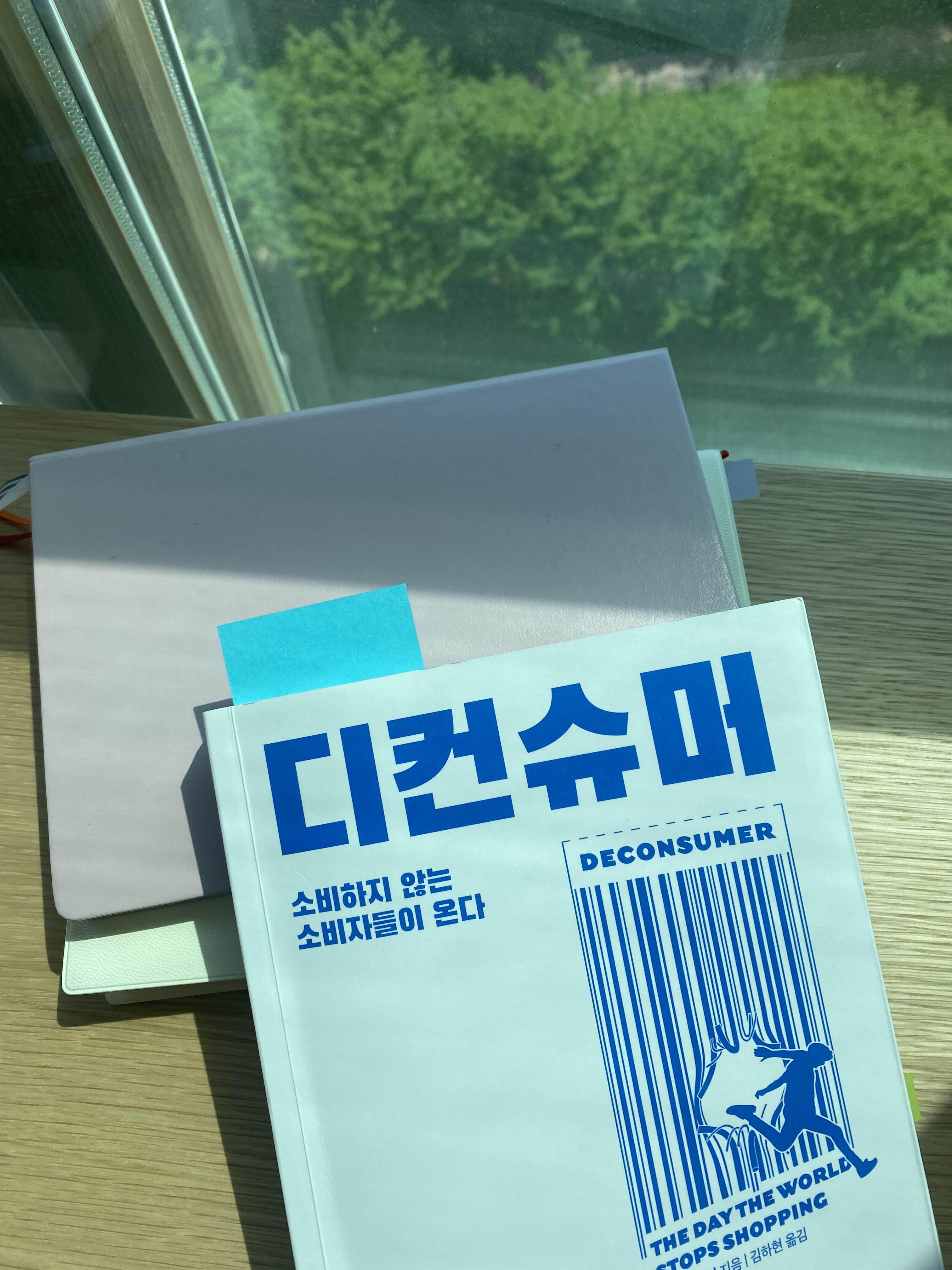
오늘 나를 멈추게 했던 문장들
/
/
/
p13
당시 인류학자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똑같은 말 못 할 기분을 느꼈다. 문화의 발전 과정 어디쯤에서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다는 느낌이었다.
p77
'분주함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맞서기 시작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저항의 상당수는 소비의 형태를 취했다. 스파, 명상 프로그램, 올 인클루시브 리조트, 정리용품.
사람들의 소비는 줄어든 적이 없고 소비 증가 속도 자체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코로나19 때 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멈췄다. 그리고 탄소 배출량이 일시적으로 대폭 줄었다. 그때 우리는 파란 하늘을 봤고 대도시 강에 생전 처음 보는 물고기들이 등장했으며 일부 도시에서는 별이 보였다. 먼 우주에서 누군가 인간을 본다면 이렇게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무감각하게 하고 있는 종족이 이해가 안되겠지?
지금과 같은 많은 소비를 하고 사는 삶이 보편화된 건 얼마 안됐다. 1970년대만 해도 미국에서 한때 일요일은 진짜 휴식하는 날이었다. 가게들은 문을 닫았고 사람들은 쇼핑을 하지 않았다. 스포츠를 하고 밀린 신문을 읽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 생산적인 일을 하기 보다는 정말로 쉬었다.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토록 소비가 만연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지금은 배달과 외식이 거의 당연시 되는 일이지만, 어렸을 때는 외식이라는 것은 특별한 날에 하는 일이었다.
미국에서는 1961년 대법원 판결에서 "국가는 하루를 여느 날과 다른 휴식과 평안, 휴양, 평정의 날로 정하고자 한다. 이날은 모든 가족 및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즐길 수 있는 날, 격렬한 매일의 경제활동에서 분리된 비교적 고요한 날, 주중에는 만날 수 없는 친구와 가족을 방문할 수 있는 날이다(p72)"라고 선언했다. 판결문에 이런 문장이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일요일은 그야말로 다른 요일과는 '다른 날'이었다!
'이 작은 책은 언제나 나보다 크다 > 365 days to go, 읽고 쓰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43 days to go, 일부러 물건을 오래 못 쓰게 만들어 판다고? (0) | 2023.05.03 |
|---|---|
| 244 days to go, 우리는 하루에 보통 수천 개의 광고를 본다 (0) | 2023.05.02 |
| 246 days to go, 죽음을 기억하라 (0) | 2023.04.30 |
| 247 days to go, 침묵과 고요에 귀 기울이기 (0) | 2023.04.29 |
| 248 days to go,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 (0) | 2023.04.29 |




댓글